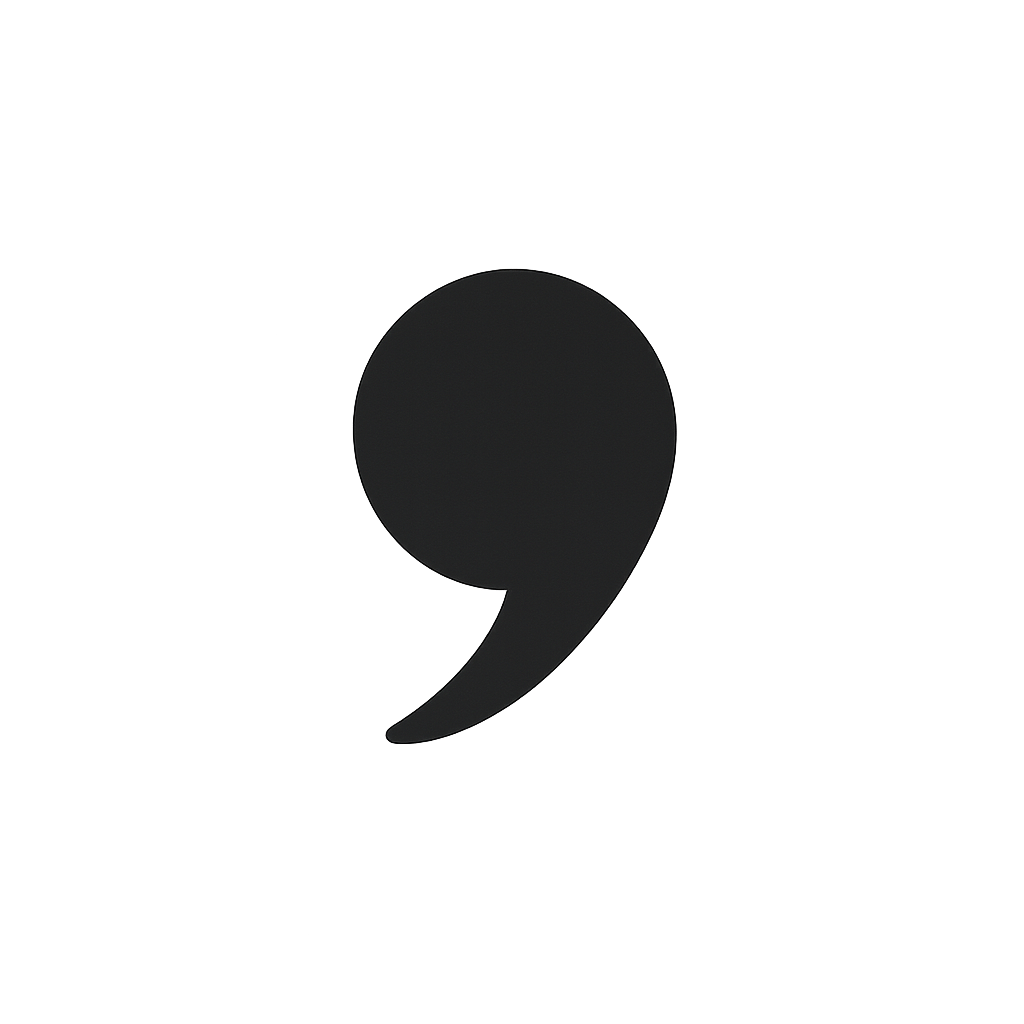END & AND, STOP
권고사직·합의퇴직인지 해고인지 판별 기준 본문
⚖️ 권고사직·합의퇴직인지 해고인지 판별 기준
“내가 사직서를 냈지만, 정말 내 의사였을까?”
근로기준법과 판례로 보는 권고사직·합의퇴직 vs 해고의 경계선

🧠 핵심 요약 (한눈에 보기)
📌 관련 법령: 근로기준법 제23조, 제27조
📌 핵심 쟁점: 자발적 퇴직 의사 존재 여부
📌 판단 기준: ①근로자의 자유의사 ②사용자의 종용 정도 ③형식과 실질 일치 여부
📌 대표 판례: 대법원 2013두18366, 2017두38882
1️⃣ 법적 구분 — “형식보다 실질이 중요하다”
📜 근로기준법 제23조 (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)
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.
📜 근로기준법 제27조 (해고의 서면 통지)
해고는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, 이를 위반하면 효력이 없다.
💡 핵심 요지:
사직서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라면,
그건 “해고”다.
2️⃣ 권고사직·합의퇴직 vs 해고의 구분 기준
키워드: 권고사직, 합의퇴직, 부당해고, 자발적의사
| 근로자의 의사 | 자발적 동의 있음 | 강요·압박에 의한 비자발적 |
| 사용자의 행위 | 제안·설득 수준 | 일방적 통보·지시 |
| 사직서 작성 과정 | 충분한 숙려기간 제공 | 강압·즉시 작성 |
| 후속 조치 | 퇴직금 정상 지급, 권리 유지 | 급작스런 인사조치, 권리 제한 |
| 법적 성격 | 합의 해지 | 사용자의 해고행위 |
💡 TIP:
법원은 “사직서 제출 여부보다 제출 당시 상황을 더 본다.”
3️⃣ 주요 판례 분석 — “형식은 사직, 실질은 해고”
키워드: 대법원판례, 사직서강요, 부당해고, 자유의사
📍 대법원 2013두18366 (형식은 사직, 실질은 해고)
- 상사가 “지금 사표 내면 깔끔하게 끝나지만, 안 내면 해고” 발언
➡️ 대법원: “강요된 사직 → 부당해고 인정”
➡️ 근로자 원직복귀 + 임금상당액 지급
📍 대법원 2017두38882 (합의퇴직 인정)
- 회사가 인력감축 상황에서 권고,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동의
➡️ “협의·보상·숙려기간이 충분했다” → 합의퇴직 인정
📍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#### (형식적 합의 부당 판정)
- 인사팀이 ‘사직서 미작성 시 불이익’ 고지
➡️ “실질적으로 해고”로 판단
📍 부산지법 2022가단#### (합의의사 부정)
- 근로자가 울며 사직서 작성, 증인 진술 확보
➡️ 법원: “자유의사 결여 → 해고로 봄.”
💬 판례 공통점:
자발성의 여부가 권고사직과 해고를 가르는 핵심이다.
4️⃣ 사용자(회사) 측 실무 체크리스트
✅ 1. 충분한 숙려기간 부여
→ 최소 24~48시간 이상 생각할 기회 제공
✅ 2. 자발적 의사 서면 확보
→ “본인의 자유의사로 퇴직함” 문구 명시
✅ 3. 금전적 보상 및 조건 명확화
→ 퇴직 위로금, 잔여 연차 등 구체적 기재
✅ 4. 압박 발언 금지
→ “사직 안 하면 불이익” 언급은 부당행위로 간주
✅ 5. 퇴직 합의서 작성 시 증인 입회 권장
→ 법적 분쟁 시 증거력 강화
💡 핵심:
“선의의 권고”도 기록이 없으면 “강요된 해고”로 오해된다.
5️⃣ 근로자 측 대응 절차
📌 1단계: 증거 확보
- 대화 녹음, 문자·메일, 사직서 작성 정황 등 기록
- 타인 진술 확보
📌 2단계: 노동위원회 구제신청
- 신청 기한: 사직일(또는 해고일)로부터 3개월 이내
- 결과: 해고로 판정 시 복직 + 임금상당액 지급
📌 3단계: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가능
- 강요된 사직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 청구 가능
📘 대법원 2013두18366 요지:
“형식상 사직이라도,
실질적으로 사용자의 강요나 압박이 있으면 해고로 본다.”
🌿 결론 — “사직서 한 장이 모든 걸 결정하지 않는다”
📍 사직의 자발성이 없다면, 법은 이를 “해고”로 본다.
📍 “사직서를 썼다”는 이유로 권리 포기는 불가능하다.
⚖️ 핵심 요약:
- 권고사직과 해고의 구분은 ‘형식이 아닌 실질’
- 자발성·숙려기간·강요 여부가 판단 기준
- 강요된 사직은 부당해고로 원직복귀 가능
- 근로자는 증거 확보로 권리 회복 가능
🎯 핵심 문장
💬 “사직서가 아니라, 그 사직이 자발적이었는가가 문제다.”